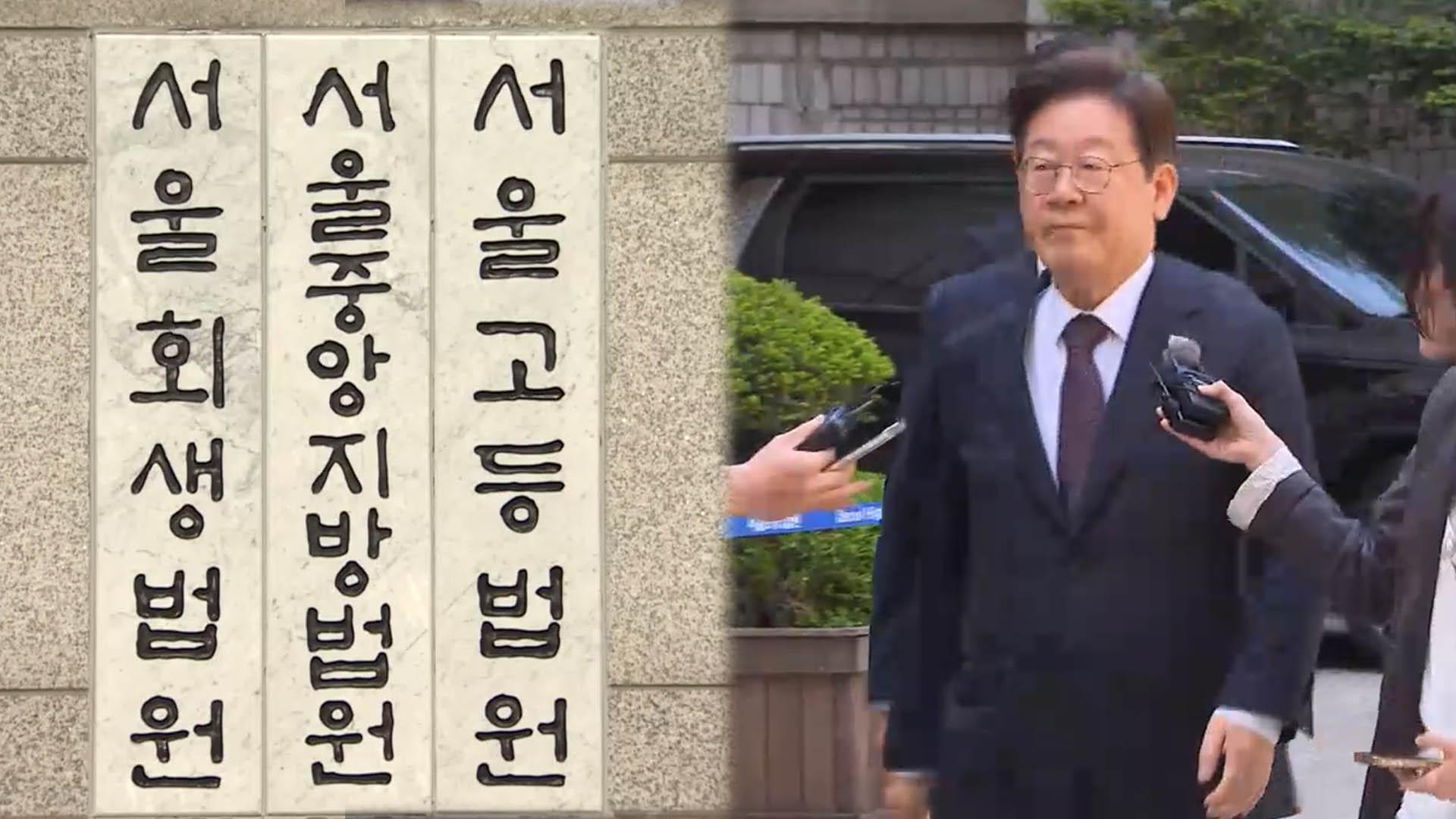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: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
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: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
00:00
00:00
'맹탕' 연금개혁 논란…해외처럼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
[앵커]
주요 수치가 빠진 연금개혁안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.
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결해왔을까요.
결국, 사회적 합의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.
최덕재 기자입니다.
[기자]
내는 돈 '보험료율'과 받는 돈 '소득대체율', 받는 나이 '수급개시연령' 등 핵심 수치를 빼, '맹탕'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연금개혁안.
영국의 경우 2007~2014년 연금개혁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도해 해결했습니다.
소수의 전문가로 꾸려진 연금위원회가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고, 영국 정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.
독일과 스웨덴은 각각 2001년과 1990년대에 장기 실업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 노조, 야당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.
전문가들이 주도하든, 정치권이 주도하든, 공통점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.
문제는, 우리의 개혁을 누가, 언제쯤 할 수 있을지,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개혁안이 국회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는 내년 6월.
4월에 총선인 점을 고려하면 논의를 할 주체도, 기간도 애매합니다.
여기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, 자동안정화장치 도입, 확정기여 방식 등 개념도 생소한 과제를 제시해 자칫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.
<윤석명 /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> "40대 50대는 20대 30대보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. (지급 액수) 자동안전장치를 도입을 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
만약 이번에도 또 제대로 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, 향후 세대간 갈등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
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
#연금개혁 #국무회의 #맹탕 #영국 #독일
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(끝)
[앵커]
주요 수치가 빠진 연금개혁안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.
ADVERTISEMENT
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해결해왔을까요.
결국, 사회적 합의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.
최덕재 기자입니다.
[기자]
내는 돈 '보험료율'과 받는 돈 '소득대체율', 받는 나이 '수급개시연령' 등 핵심 수치를 빼, '맹탕'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연금개혁안.
영국의 경우 2007~2014년 연금개혁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도해 해결했습니다.
소수의 전문가로 꾸려진 연금위원회가 개혁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고, 영국 정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.
독일과 스웨덴은 각각 2001년과 1990년대에 장기 실업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 노조, 야당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.
전문가들이 주도하든, 정치권이 주도하든, 공통점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.
문제는, 우리의 개혁을 누가, 언제쯤 할 수 있을지,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개혁안이 국회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는 내년 6월.
4월에 총선인 점을 고려하면 논의를 할 주체도, 기간도 애매합니다.
여기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, 자동안정화장치 도입, 확정기여 방식 등 개념도 생소한 과제를 제시해 자칫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.
<윤석명 /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> "40대 50대는 20대 30대보다 보험료 인상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. (지급 액수) 자동안전장치를 도입을 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"
만약 이번에도 또 제대로 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, 향후 세대간 갈등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
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
#연금개혁 #국무회의 #맹탕 #영국 #독일
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
(끝)
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!
- jebo23
- 라인 앱에서 'jebo23' 친구 추가
- jebo23@yna.co.kr
ⓒ연합뉴스TV,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
ADVERTISEMENT
이 기사 어떠셨나요?
-
좋아요
0 -
응원해요
0 -
후속 원해요
0
이 시각 주요뉴스
경제 최신뉴스
많이 본 뉴스
- 연합뉴스TV
- 포털
- 유튜브